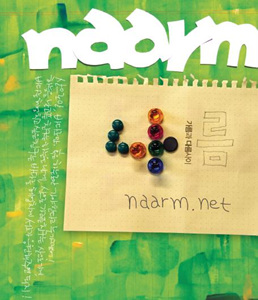
복음과 상황의 정기구독자였지만, 그렇게 성실히 읽지는 못하고 있었던 나는 2009년에 들어서면서, 올해는 복음과 상황을 좀 열심히 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었다. 그리고 집어든 2009년 1월호 복음과 상황. 열심히 읽고 있는 나의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으니, 응? 청어람 정치웹진? 듣보잡이들이 왔다는데, 진짜, 왠 듣보잡이들이지? 잠깐,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잖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잖아. 분홍색 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나는 그 글을 참 흥미롭게도 읽었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명의 듣보잡이가 되었다. 그 듣보잡이가 지금은 나름의 편집장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복음과 상황에 들어갈 글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인연이라는 녀석이 시작되는 방식은 참 기묘하기도 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재미난 우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
나는, 왜, ‘돈도 안되는’ 나름을 만들고 있는거지?
이름도 없던 웹진에 <나름>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가름과 다름 사이’ 라는 말을 만들어낸 누군가를 향해 다같이 뜨거운 환호와 공감을 보내고, (지금 봐도 명작이다) 과연 웹진이 나오기는 하는걸까, 라는 모두의 걱정과 의문 속에 웹진 <나름> 창간준비 1호가 발행됐다.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밤에, 태터툴즈를 활용해 웹진 <나름>의 메인을 ‘나름대로’ 편집하다가, 까칠한 성격 덕에 이것저것 체크사항들을 체크하다가 그만 덜컥 편집장이 돼버렸다. 이건 뭥미, 싶었으나 -_- 가만히 생각해본다. 나는, 왜, 돈도 안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글을 왜 쓰지 않느냐,는 물음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다. 그건 내가 글을 잘 쓰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학교 때 학보사를 했던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의 행보를 언론사, 잡지사 등으로 생각해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스스로 글을 쓸 깜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사실 글을 쓰는 일을 Job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쓰고 싶지 않은 글을 쓰는 일이 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글을 쓴다는 행위에 어떤 특별한 의미 같은 것을 부여했던 것 같다. 하여, 내가 쓰는 글이 표현해주는 것은, 나의 생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어야만 했다. 졸업 후 3개월간 근무했던 작은 신문사에서, 나는, 스스로가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밖에 없었다. 취직을 알리는 메일에 대학 시절 은사님은 ‘네가 쓰게 될 글에는 아마도 네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장을 보냈었다. 정답이었다.
이 혼탁한 시절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과 밥만 먹더라도, 생각의 충돌에 대한 두려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꾹꾹 누르다가 결국 애꿎은 소화제를 찾게 되기 일쑤다.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도 느껴지는 미묘하나 민감한 입장 차이에 가끔은 가슴이 턱 막혀온다.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갑자기 십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ㅋ) 진부한 격언이 얼마나 굉장한 명언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수다를 모두의 이야기로 공론화시킬 수 있는 곳,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든, 그걸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글’이라는 귀한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내게는 <나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바쁜 직장의 일과가 끝난 후에, <나름>의 편집을 위해 쪼개던 몇 시간이, 틈틈히 써내려가던 글들이, 출근시간에 잊지 않고 필자들에게 독려(혹은 독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그러니까, <나름>을 만드는 일이, 내게는 참 귀했다.
<나름>은 여전히 창간 준비중
도대체 창간호는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하하하하. 7호째 창간준비호를 내게 될 줄은 정말이지, 나도 몰랐다. 창간이 되면 뭐가 달라지긴 하나요? 라는 질문도 받는다. 하하하하하.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창간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쫓겨 창간호를 급조하지는 않을 작정이라는 사실이다. 조급증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공간인 웹진 <나름>에 조속히 지쳐버리는 일은 없게 되길, (사실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적어도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더 익숙해지는 그 때, 창간호라는 이름의 <나름>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혹은, 지금의 모습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결론이 난다면, 이 모습 이대로 창간호를 만들 지도 모를 일이다. 농담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창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창간호를 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했다. 주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면,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까지, 누군가는, 같은 기독 청년들에게 고하고 싶은 이야기를 <청년담론>이라는 이름으로 쓸테고,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CCM 이야기를 <노래, 너머 봄>이라는 이름으로 쓸테고, 누군가는 <신자를 신자되게 하소서>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교회 이야기를 소개할테고, 누군가는 우리가 일상처럼 쓰는 신앙 용어들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나님과 마주보다>라는 이름으로 나눌테고, 누군가는 삶 속의 사소한 생각들을 <내가 되는 꿈>이라는 일기로 공유할테고,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극/영화 이야기를 <그림자리뷰>라는 이름으로 풀어내겠지. <넝마 프로젝트>라는 글을 통해 다져나간 결심들을 실제 액션으로 만들어나간 것 같은 사례도 계속 생겨나겠지. 바다 너머에 있는 ‘어엿브신’ 골드미스들은 그들의 <당돌한 선교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겠지. <국가와 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찰들도 계속되겠지. 그리고, 여전히, 속에 담고 있는 풀어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숨을 트이게 하겠지. 함께 호흡하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겠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쓰던, 서로를 향해 쓰던 <러브레터> 역시 계속되겠지. 그렇게 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곳,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다시 진지하게,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고민이 되는 곳, 그 곳이 웹진 <나름>이 지향하는 곳이다. 바라건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또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한다. 몇 개월 전, 내가 그러했듯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