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호 동교동 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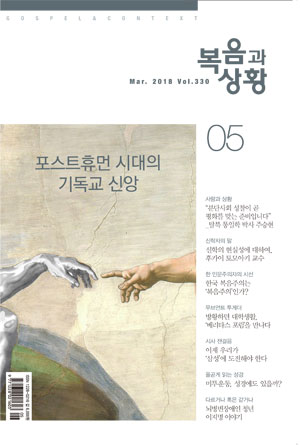
포스트휴먼(posthuman) 혹은 트랜스휴먼(transhuman)이란 용어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휴먼’(인간)보다는 ‘포스트’(이후)나 ‘트랜스’(초월)에서 느껴지는 막막함 탓 아닐까 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알파고) 대 인간(이세돌)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인간 실력자가 4 대 1로 패배한 이 대결은 진도 3.5 규모의 내적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과학기술 용어는 제게 ‘두렵고 예측불가한 미래’와 동의어로 새겨졌습니다. 과학기술 쪽으로는 워낙 문외한이라 더 그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의 충격이 잊혀져가던 올해 초반,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펴내는 계간지 <플라우> 2018년 겨울호의 ‘트랜스휴머니즘’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일원인 원마루 본지 독자통신원이 보내온 “영생불사의 인간이 온다?: 트랜스휴머니즘과 죽음의 초월”(마이클 플라토_49쪽)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냉동보존 장치를 이용한 영생불사’를 추구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과, 이처럼 과학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육체적 지적 업그레이드를 긍정하는 ‘기독교 트랜스휴머니스트 연합’ 같은 단체의 존재도 접하게 되었지요. 포스트휴먼이나 트랜스휴먼에 관해서는, 지난 2017년 11월에 있었던 ‘제3회 과신대 포럼: 포스트휴먼과 기독교 신앙’이 자극과 고민을 안겨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 콘텐츠에는 포스트휴먼 시대가 흔하게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사회의 인간에 대한 상상력을 담아낸 다양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인간의 적극적 융·결합을 통해 육체적·지적·기능적으로 ‘증강’된 새로운 인간이 출현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그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디쯤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 물음을 궁구하고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지요.
옥명호 편집장 lewisist@gosc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