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호 스무살의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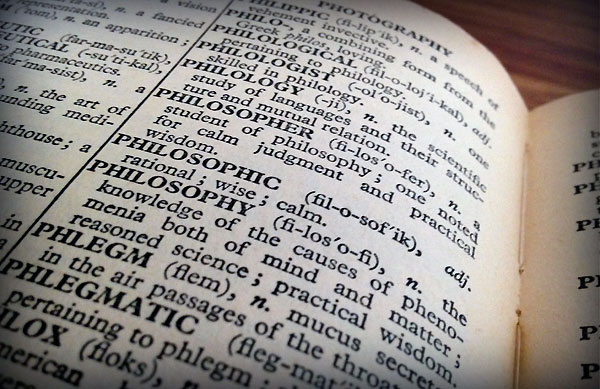 | ||
‘우리 아들 이러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다가 철학과 간다고 하면 어쩌지.’ 아버지와 했던 대화에서 처음으로 ‘철학과’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제가 9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글을 읽고부터 독서력이 왕성한 아들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도서관에서 빌린, 가파른 도서관 길을 오르며 흘린 ‘팥죽땀’이 덕지덕지 묻은 책을 책장 옆에 놓아주던 아버지. 그 땀에 보상을 하듯, 저는 책을 ‘쌓아두고’ 읽는 유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뒤르켐의 《자살론》을 들추면서 책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는 아들을 보며 ‘우리 아들이 철학과에 가려나’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씨가 된 거지요. 옛말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10년 후 저는 철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철학과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저를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 상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던 대안 고등학교와 담임선생님의 반대에도 처음으로 수능시험을 준비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찰나의 고민도 없이 모든 대학 입학 원서에 철학과를 적을 즈음의 저는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걸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오만에 푹 젖어있었고, 곧 죽어도 철학과에 가서 죽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미쳤었지요. 철학에, 인문학에 말입니다.
철학과에서 4학기를 마친 지금, 3년 전의 제 오만함과 결심들을 떠올리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아버지가 설립한 인문학교인 ‘로고스서원’을 이어나갈 꿈도 전혀 생각지 못했고, SNS에서 제 글을 읽는 수천 명의 인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철학이 흥미로웠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요. 인문계 90%가 논다는 이 시대에,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스스로를 비웃는 이 시기에, 순수를 좇는 인문학을 꿈꿨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