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호 에디터가 고른 책] 《위대한 공존》(브라이언 페이건 지음 / 김정은 옮김 / 반니 펴냄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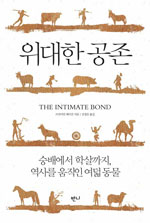
지구 역사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담았다. 적어도 1만5천 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과 늑대(개)의 관계에서 시작해 염소, 양, 돼지, 소, 당나귀, 말, 낙타와 함께한 역사를 포착한다. 이들의 고유한 자질이 인류에 크게 이바지했음에도, 우리는 그 위대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겸손한 동물이 최초의 세계화 과정을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 당나귀는 유프라테스 강과 지중해를 연결했고,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과 터키 중부를 이어주었다.”(176쪽)
인간과 동물의 오랜 관계는 ‘동반자’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도시화가 계속되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친밀한 관계는 깨졌다. 몇몇 선택받은 동물들만 존중을 받았고, 나머지는 ‘상품’과 ‘도구’로 전락했다. 고고학자인 저자는 동물권 논란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동물과 인간이 2만 년 넘게 이어온 끈끈한 우정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인류와 함께 사냥하던 영민한 동료에서 가족이 된 첫 번째 동물, 개’ ‘최초의 재산이자 혼사와 동맹의 징표, 염소와 양’ ‘인간의 경쟁 상대에서 성대한 축제의 주역으로, 돼지’ ‘힘과 왕권의 상징, 최초의 짐 운반 동물, 소’ ‘세계화를 이끈 숨겨진 영웅, 당나귀’ ‘전장을 누비며 제국을 개척한 전사, 말’ ‘지구의 가장 뜨거운 땅을 가로지른 무역의 주인공, 낙타.’
착취와 학살의 위협 앞에서도 인류와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은 위대한 ‘벗’들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어느덧 그 명맥에 스르르 젖어든다. 책 끄트머리 저자의 일갈은 그래서 더 아프다.
“인간은 먹기 위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몸을 치장할 물건을 얻기 위해 다른 동물을 죽인다. 수천 년 동안 인간과 다른 동물을 괴롭히고 죽여왔다. 곰이나 사자를 야만스러운 포식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간이야말로 진짜 학살자다.”(373쪽)
우리는 ‘위대한 공존’의 길로 회귀할 수 있을까? 2만 년 전 크로마뇽인이 완벽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실, 즉 동물은 사람이 빚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