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호 동교동 삼거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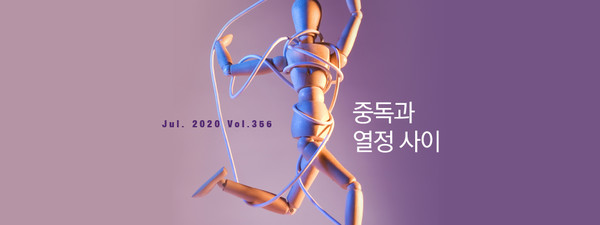
일상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는 매우 폭넓게 쓰입니다. 술, 담배, 음식을 취하는 중독에서부터 특정 물건을 수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지요. 이 단어의 라틴어 어원(addictus)을 찾아보니 ‘헌신한’ ‘탐닉한’ ‘골똘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명사로는 ‘노예로 판결된 채무자’를 뜻합니다. 어떤 대상에 꽉 묶여 노예가 된 상태를 ‘중독’이라 여기는 현대의 맥락과도 닿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알코올·성·약물 중독 등을 심각하게 진단하며 ‘나는 아니다’ 꼬리를 자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더 치명적인 중독은 은밀하게 (때로는 우아한 모습으로) 개인 속에 감춰진 중독일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투기, 사교육 의존, 성취 및 깨달음 갈망, 정치 과잉, 종교적 헌신, 자아 몰입…, 때로는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런 열심들은 범죄나 범법이 아니니 괜찮은 걸까요?
이번 커버스토리는 우리의 은밀한 탐닉들이 이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얽히고설켜 있는지 들추었습니다. 극악한 범죄가 용인되는 사회, 전에 없던 강력한 감염병이 창궐하는 세계를 만든 것은 어쩌면 우리 개개인의 ‘고상한’ 중독이 모인 결과는 아닐까 하는 가설에서 출발한 기획이었지요. 중독의 관점으로 종교(정신실), 정치(김지방), 안정(진영·제민), SNS 작동방식(박일아)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고민하기를 권합니다.
상담가들은 공통적으로 “중독의 위험성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성가 리처드 로어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중독이 자아 중독, 자아 탐닉으로 수렴되며 “자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회개”라고 역설합니다. 중독은 우리가 모두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확인해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지상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세계의 보편적 죄악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만인에 대하여, 각각의 개인에 대하여 분명히 죄인입니다.”(《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중 조시마 장로)
알렉산더 슈메만은 주기도문을 해설한 《우리 아버지》(비아)에서 위 대사를 인용하며 “양심이란 바로 이러한 깊은 확신, 분명 죄를 지었다는 확신, 죄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자각, 어떤 범죄나 악한 행위가 아닌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악, 우리 심연에서 일어난 타락으로 인해 저 모든 범죄가 일어났다는… 확신”이라 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를 설명하면서였지요.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7월입니다. 어김없이 아귀다툼에 휩쓸리더라도, 7월의 푸르름이 우리의 죄와 중독을 성찰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자아의 목소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이범진 기자 poemgene@goscon.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