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호 이한주의 책갈피]
아내에게 다시 한 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돈 이 원만 안 해줄 테여?”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댁 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되나 좌우간 이렇다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울화가 터져 죽을 지경이었다. …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똑똑하겠다, 돈 이 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겠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체도 안 하니 괘씸한 듯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 번, “돈 좀 안 해줄 테에?”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42쪽)
춘호는 ‘이 원’만 있으면 노름판에 뛰어들어 큰돈을 벌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아내를 닦달한다. 춘호가 남자인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돈을 아내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그녀가 ‘어떻게라도’ 돈을 구해올 수 있는, 나이 젊고 얼굴 예쁜 여자이기 때문이다. 춘호 아내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쇠돌 엄마를 찾아간다. 쇠돌 엄마는 동네 부자이자 호색한인 이 주사와 정을 통하는 사이로, 춘호 아내는 이 주사에게 겁탈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주사와 마주칠까 봐 쇠돌 엄마 집을 피해 다녔는데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이 쇠돌 엄마밖에 없다. 큰맘 먹고 쇠돌 엄마를 만나러 갔더니 쇠돌 엄마는 없고 하필 소낙비가 내려 온몸이 젖는다. 이때 이 주사가 이 집에 찾아오고, 춘호 아내를 본 그는 거리낌 없이 그녀를 탐한다. 춘호 아내는 이 주사에게 몸을 허락하는 대가로 돈 이 원을 약속받는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 춘호는 늦게 돌아왔다며 아내를 때리려다 내일 돈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돌변해서 다정하게 군다. 그리고 다음 날, 춘호는 정성스럽게 아내를 단장시키며 외출을 돕는다.
남편은 아내 손에서 얼레빗을 쑥 뽑아들고는 시원스레 쭉쭉 내려빗긴다. 다 빗긴 뒤, 옆에 놓인 밥 사발의 물을 손바닥에 연신 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르하게 발라놓았다. 그래놓고 위서부터 머리칼을 재워가며 맵시 있게 쪽을 딱 찔러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사코 공을 들여 삼아놓았던 짚신을 아내의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골을 내주었다. “인제 가봐!” 하다가, “바루 곧 와, 응?” 하고 남편은 그 이 원을 고히 받고자 손색 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를 모양내 보냈다. (58쪽)
조선의 인민이 일제의 수탈에 시달렸던 1930년대 ‘들병이’라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다. 춘호 아내처럼 남편에게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 성매매하는 유부녀들이다. 청년 김유정은 들병이들과 친분이 있었고 〈소낙비〉뿐 아니라 〈총각과 맹꽁이〉·〈솥〉·〈안해〉·〈산골 나그네〉 등 여러 작품에서 이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들병이 아내와 무능한 남편이 나오는 김유정의 작품을 읽으면 떠오르는 부부가 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사라다. 그들 역시 고향을 떠난 떠돌이였고, 극심한 흉년으로 생존을 위협받았다. 이집트로 들어가야 먹고살 길이 열리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한 여호와를 믿기보다 자기 아내를 생존의 도구로 삼는다. 아내를 누이라 속여 이집트 남자들의 호의를 얻을 계획을 세우고 심히 아리따운 아내의 미모를 전시해 소문이 나게 한다. 사라는 춘호 아내처럼 힘없는 떠돌이 남자가 가진 마지막 소유물이었고 무능한 남편의 비열한 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라가 파라오에게 가던 날 아침을 상상해본다. 아브라함도 춘호처럼 파라오 후궁으로 가는 사라를 제 손으로 정성스럽게 단장시켜 보냈을까? 식민지 조선의 들병이 남편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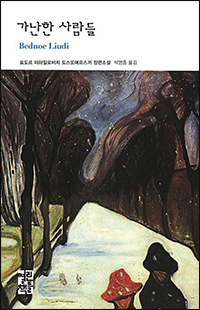
김유정이 조카 김영수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한 책 목록에는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열린책들)이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등단작이다. 이 소설은 서간체소설로 40대 후반 하급 공무원 마카르 제부스킨과 20대 초반 고아 처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주고받은 편지를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주인공 바르바라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마카르의 경제 상황을 염려할 만큼 사려가 깊다. 그녀는 글을 읽고 쓸 줄 알 뿐 아니라 마카르에게 푸시킨과 고골의 작품을 추천할 만큼 지적 수준이 높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가난이 남긴 깊은 상처가 있다. 열네 살 때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걱정과 상심 속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친척 집에 얹혀살며 설움을 당했고, 첫사랑이 가난으로 고생하다 죽는 걸 보았고, 얼마 뒤 어머니마저 병으로 잃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가난이었고, 그녀의 이웃들도 가난 때문에 비참하게 산다. 바르바라는 자신을 돕고자 마카르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쓴다.
오 나의 벗이여! 불행은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불행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서로서로 피해야 합니다. (134쪽)

소설가 김유정은 경술국치에서 일제강점으로 이어지는 1930년대를 살았던 젊은이다. 〈봄봄〉·〈동백꽃〉 같은 해학적인 작품으로 잘 알려져있지만 사실 그 시대의 비애를 담은 작품을 더 많이 썼다. 스물일곱이던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등단작 〈소낙비〉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다(《동백꽃-김유정 단편선》 수록). 이 소설은 거듭되는 흉작으로 빚을 지고 고향을 떠난 춘호 부부 이야기다. 그들은 야반도주해 어느 산골 마을에 정착했지만 떠돌이에게 소작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점점 더 궁핍해진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밑천이 필요한데 춘호는 이 밑천을 아내에게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