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호 이한주의 책갈피]
그런 유대인들이 권력과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추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신도들을 뒤쫓고 그들을 궤멸시킬 때까지 박해했을 걸세. 유대교와 기독교, 물론 이슬람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꿀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은 자기들 손에 수갑, 쇠창살, 지배권, 지하 고문실과 교수대가 없을 때뿐이지. 이런 모든 종교는, 지난 세기에 태어난 수많은 종교 중에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고 있는데, 모두 우리를 구원하러 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피를 쏟게 만드는 것이라네. (103쪽)
발드는 한때 이스라엘이 아랍과 벌이는 전쟁을 신성한 전쟁이라 믿었던 애국자이자 민족주의자였다. 하지만 10년 전 전쟁에서 외아들을 잃은 후로는 그런 죽음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약속과 세상의 회복을 믿지 않는다. 아탈리아 역시 남자들의 세계와 전쟁에 환멸을 느끼며 이렇게 말한다.
이제부터 아랍인들은 날마다 패배자가 당하는 재앙을 살아야 하고 유대인들은 밤마다 보복을 당할까 봐 떨며 살아야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좋은가 보죠. 두 민족은 증오와 독에 잡아 먹힌 후 둘 다 복수와 정의라는 훈장을 달고 전쟁을 마쳤으니까요. 복수와 정의가 가득 차 흐르는 강물들이 됐죠. 그렇게 정의가 넘쳐나다 보니 온 땅이 묘지로 덮이고 가난한 마을들이 수백개씩 폐허가 되어 지워지고 사라져 갔어요. (278쪽)
슈무엘은 세상에 있는 힘을 모두 합한다고 해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다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광신도를 온건한 사람으로, 복수하고 시비를 걸려는 사람을 친구로 바꾸는 일에 이스라엘의 생존이 달렸다 말한다. 공존을 거부하는 현대 이스라엘을 향한 작가의 호소다. 슈무엘은 유대 민족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까 상상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메시아가 오는 순간 온 땅에서 피 흘림이 그치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항하여 칼을 드는 일이 없어지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하는 법을 배우지 않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 있다고 지적했지요. 그것들은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가 살던 시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각처에서 잠시라도 유혈 사태가 그친 적이 없어요. (171쪽)
구약의 하나님을 폭력적인 전쟁의 신이라 비판하는 이들에게,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변호하면서 그 증거로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예수가 세상에 온 후로도 전쟁은 그친 적이 없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도 함께 예언했다.
그런데 왜? 왜, 메시아는 왔는데 평화는 아직 세상에 오지 않는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은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니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더 충실한 것 아닌가? 예수를 좋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 슈무엘의 고민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황석영 작가의 장편소설 《손님》(창비)은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신천군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을 다룬다.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곳곳에서 집단 학살의 비극과 광기가 일어났다. 3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진 ‘신천 학살 사건’은 황해도 지역에 일찍부터 뿌리를 내렸던 개신교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벌어진 사건이라서 더 특별하고 비극적이다.
소설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류요섭 목사가 고향 방문단에 선정되어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따라 전개된다. 그의 품에는 고향 방문 며칠 전에 죽은 형 류요한 장로의 뼛조각이 있다. 류요한은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라는 동생의 말에 크게 화를 냈었다.
내가 왜 용서를 빌어? 우린 십자군이댔다. 빨갱이들은 루시퍼의 새끼들이야. 사탄의 무리들이다. 나는 미가엘 천사와 한편이구 놈들을 계시록의 짐승들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께서 명하시면 나는 마귀들과 싸운다. (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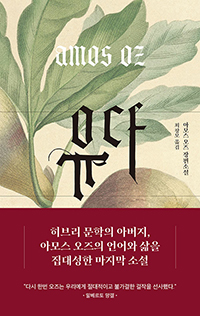
아모스 오즈는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던 저명한 작가였다. 현대 히브리 문학의 아버지라 칭송받았던 그는 조국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함께 받았다. 아랍 국가들과의 공존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파 시온주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생명과 평화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가 75세에 쓴 마지막 소설 《유다》(현대문학)도 이 문제를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