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호 이한주의 책갈피]
“우리가 지금 아이를 포기하면 소행성의 충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다면 충돌시켜야겠구나, 하고 판단할지도 몰라.”
“어딘가의 누군가라니, 누구?”
“몰라. 아득히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겠지.”
“예를 들면 신?”
“그래서 말인데, 반대로 우리가 출산을 선택하면 말이야.”
“소행성이 피해 간다?”
“예를 든다면 말이지.”
“그거 꼭 무슨 종교 같다.” (76쪽)
후지오는 그들이 아기를 낳기로 결정하면 신이 판단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는다. 아내 미사키는 이렇게 말하는 후지오에게 ‘무슨 종교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종교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주는 종교의 긍정적인 힘을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후지오는 멸망을 앞둔 세상에서 아이를 지키리라 생각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가족을 상상한다. 아이와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심한 후지오는 세상의 끝에서 가장 용감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소설은 그 후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지 않지만 왠지 후지오의 바람대로 소행성이 비껴갔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해 폐허만 남은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코맥 매카시의 소설 《로드》(문학동네)가 보여주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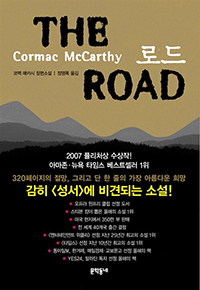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세상에 한 남자와 그의 어린 아들이 있다. 소설은 두 사람이 남쪽으로 가는 여정을 따라 전개되는데 독자는 이들과 함께 종말 이후의 세상을 본다. 대재앙으로 모든 문명과 질서가 사라진 지구에 ‘우연히’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보다 약한 이들을 사냥하고 사육하며 잡아먹는다. 남자와 아들은 숲속에서 사람들이 식인 행위를 하는 걸 목격하고, 외딴집에서 식인용으로 감금되어있는 사람들을 보고, 심지어 누군가 먹다 남긴 그을린 어린아이 시신을 발견한다. 그때마다 남자는 아들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한다. 남자는 아들과 함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죽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남아 아이에게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미안하다. 재난과 함께 세상에는 먹을 것이 사라졌고, 배고픈 인간에게는 도덕과 양심이 사라졌다. 약자가 강자의 먹이가 되는 무정하고 폭력적인 세계다.
생각해보니 구약시대에도 이런 참상이 벌어진 적 있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대, 이웃 나라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백성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성벽을 걷던 왕은 한 여인의 하소연을 듣는다.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왕하 6:29, 새번역) 어미가 아이를 잡아먹고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어제 내 아이를 같이 삶아 먹었으니 오늘은 너의 아이를 먹는 것이 나의 권리라 생각한다. 감추어놓은 이웃의 아이를 잡아먹게 해달라는 여인 앞에서 왕은 할 말을 잃는다.
《로드》의 세상은 굶주린 사마리아 성 같다. 남자는 이런 세상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리라 결심하고 실제 살인도 한다. 하지만 아이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다친 사람을 돕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는 곳마다 연민의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나무라면서도 “저 아이가 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거야” 말하며 아들에게서 신의 뜻을 찾는다. 남자가 길에서 죽어갈 때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보면 신이 아들을 통해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작은 아이 기억나요, 아빠?
그래. 기억나.
그 아이 괜찮을까요?
응. 그럼. 괜찮을 거야.
길을 잃었던 걸까요?
아니. 길을 잃었던 것 같지는 않아.
길을 잃었던 걸까봐 걱정이 돼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길을 잃으면 누가 찾아주죠? 누가 그 아이를 찾아요?
선善이 꼬마를 찾을 거야. 언제나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316-3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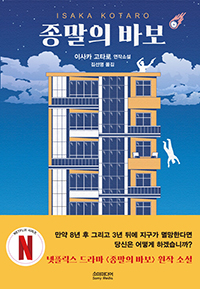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종말이 올 때까지 만들어질 것 같다. 작년에도 류츠신의 《삼체》(자음과모음, 전 3권)와 이사카 고타로의 《종말의 바보》(소미미디어)가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두 소설에서 인류는 각각 외계인 침략과 소행성 충돌로 종말을 맞을 운명인데 예정된 시간표가 다르다. 《삼체》에서는 외계인이 보낸 침략 함대가 450년 후 지구에 도착하는데, 《종말의 바보》에서는 소행성이 8년 뒤 지구와 충돌할 예정이다. 시간표가 다르니 종말의 느낌도 다르다. 450년은 나 자신은 물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들 자식의 자식까지 일반적인 수명을 누리고 자연사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사이에 뭔가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8년은 너무 짧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