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호 잠깐 독서]
대중을 위한 ‘공동선’ 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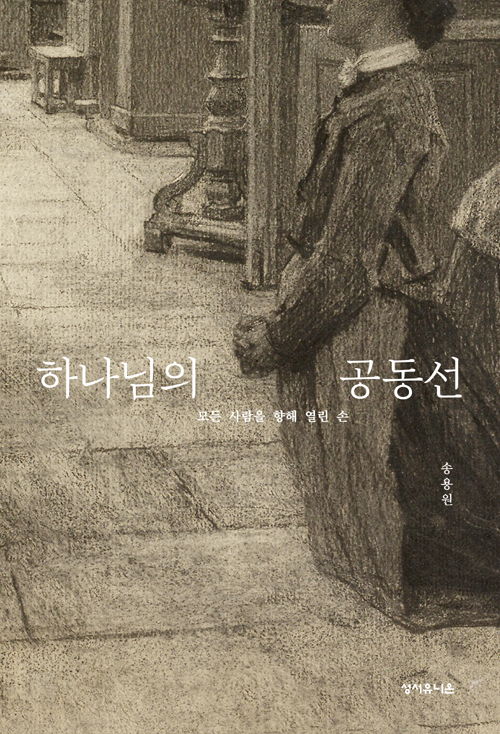
하나님의 공동선
‘공동선’(common good) 연구로 박사학위를 한 신학자 송용원 목사(은혜와선물교회 담임)가 쓴 두 번째 신간. 공동체 전체를 강조하는 공공성(publcity)이나 공익(public)과 달리, 공동선은 공동체와 개인을 모두 중시하는 개념으로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좋음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미 칼뱅의 신학을 공동선을 중심으로 정리한 연구서 《칼뱅과 공동선》을 냈으며, 성경적 공동선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소개할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 두 권 다 공동선을 연구한 국내 저자가 쓴 유일한 책이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의 선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잃은 양 한 마리가 반드시 돌아와야 사는 나라이지, 우리에 아흔아홉 마리나 있으니 괜찮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를 살림으로써 모두가 살게 되는 공동선의 나라입니다. 공동선 원리에 따르면, 양 한 마리라도 잃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몸과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의 비밀입니다. (236쪽)
성학대 피해자와 공동체를 함께 일으키는 회복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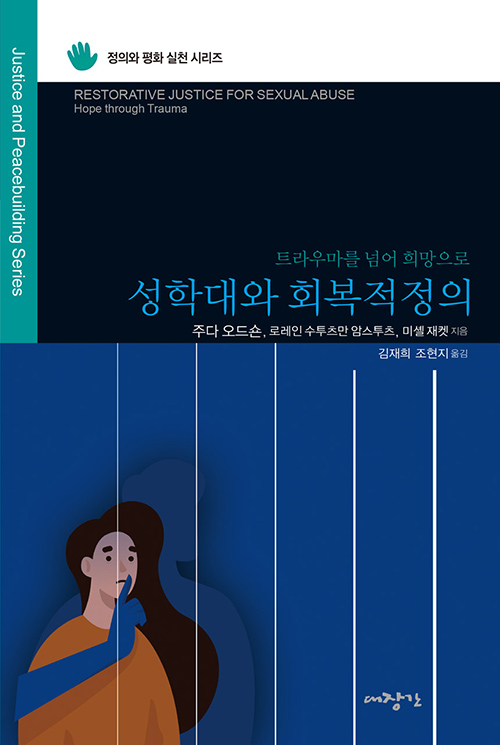
성학대와 회복적 정의
성학대를 당한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 회복적 정의는 무엇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 이 회복적 정의가 법적 공동체의 치유와 무엇이 다른지,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수용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의 질문에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성학대와 회복적 정의에 대한 정의, 피해자·가해자·공동체의 각 사례 연구 및 이에 대한 한계와 가능성, 실천 방안까지 한 권에 담아냈다.
회복적 정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회복적 정의의 실무는 성학대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이 아니며, 모든 이들이 이러한 방식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이러한 방안이 피해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성범죄자들에게 새로운 수준의 책임을 요청할 수 있음도 분명하다. 회복적 정의의 현장이나 실천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에게 성학대가 일어난 이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131쪽)
목회적·신학적으로 탄탄한 ‘교회와 신앙’ 안내서

다시 만나는 교회
‘에클레시아’(교회) 연구로 박사학위를 한 성서신학자인 박영호 목사(포항제일교회 담임)의 ‘교회와 신앙’ 안내서. ‘교회의 두 본질’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존재냐 관계냐’ ‘영생이란 무엇인가’ ‘성장에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동행’ ‘모든 사역이 중요하다’ 등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본기를 다져주는 탄탄하고 알찬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조직이 따로 있고 그 조직에 사람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거나 조직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 오전 한두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지의 문제가 아니며, 죽으면 어디로 갈지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2쪽)
종교학자가 바라보는 한국 기독교와 페미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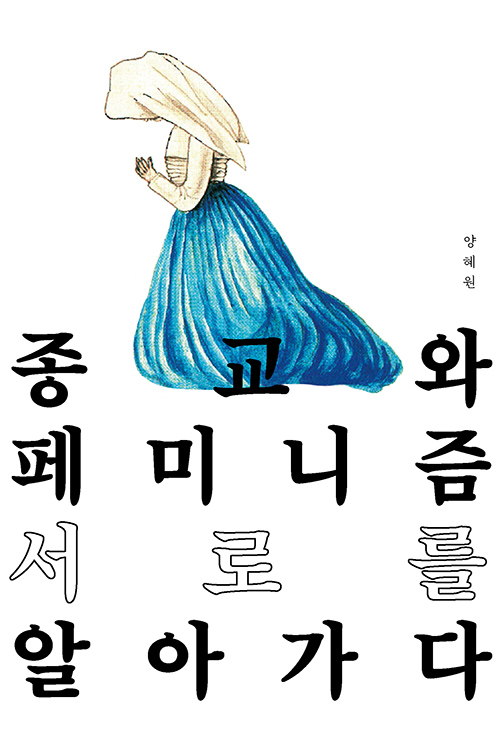
종교와 페미니즘 서로를 알아가다
페미니즘을 종교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종교학자의 시도가 녹아든 책으로, 크게 ‘한국 복음주의 페미니즘’ ‘유교 페미니즘’ ‘이슬람 페미니즘’ ‘종교와 페미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기독교와 페미니즘이 연합하는 지점도 있지만 엇갈리는 점도 있음을 밝히면서 각각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실천의 차원을 영성으로 초월해 버리려 하는 경향이 있다면, 페미니즘은 실천의 차원을 우리의 여성 됨과 남성 됨의 차원, 인간의 가장 친밀한 사랑과 뼈아픈 배신이 시작되는 그 차원으로 끌어내려 모든 것을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영성은 초월하려 하지 않으면서 초월성을 믿고, 초월성에 대한 그 믿음 덕분에 다 해체해야 할 정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붕괴되지 않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허물고 나면 그냥 폐허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 없는 해체 작업은 결국 망치를 들고 성을 부수는 자신의 욕망만 드러낼 뿐입니다. (33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