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호 에디터가 고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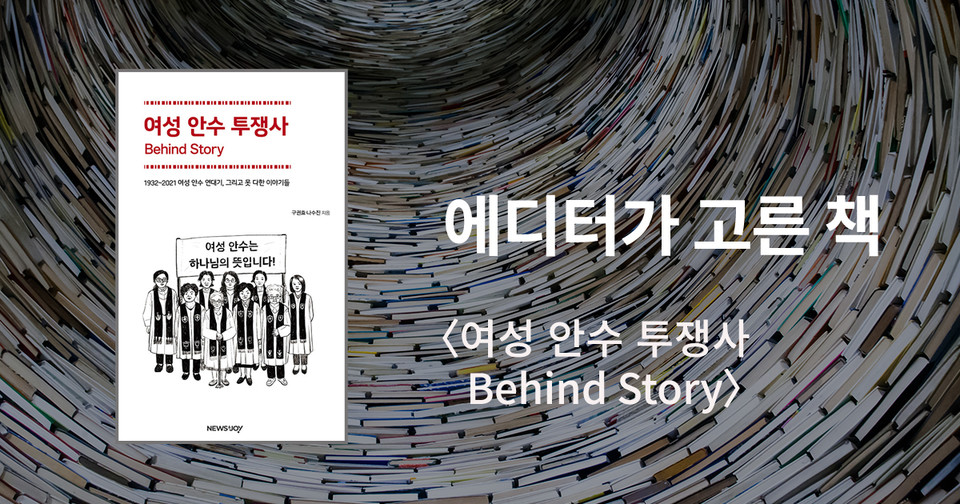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뭐가 있는지, 지인들에게 즐겨 묻곤 했다. 최근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아서 실질적인 조언을 듣고 싶기도 했지만, 질문을 시작으로 그 사람의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흥미로웠다. (상대방은 대개 한 소절로 끝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연령, 성별, 가족 구성원, 그리고 사람 성향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공통점이나 유사한 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히 또래 여성들은 그 교회에 여성 목사가 없더라도 최소한 여성 안수가 가능한 교단 소속 교회를 찾길 원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 부모님이 옮긴 감리교회를 떠올렸다. (여성 안수 이슈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정 교단을 피해서 옮기셨다.) 부교역자인 듯한 여성 목사님이 인도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는데, 적어도 한국에선 쉽게 발견되는 모습은 아니기에 눈길을 끌었다. 몇몇 교단에선 여성 리더십 자체가 불가능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사라지는 유리천장 구조는 한국 교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더 심각한 교회 문화 속에서 그분은 무엇을 감각하고 계실지.
그런 만남이 쌓여 이 책을 뽑아 들었다. ‘1932~2021 한국교회의 여성 안수 연대기, 그리고 못 다한 이야기들’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뉴스앤조이〉 기자들이 정리한 여성 안수 청원에 대한 주요 교단의 역사와 이 운동에 참여해온 10명의 여성 목사, 장로, 사제, 학자 인터뷰가 담겼다. 아직도 여성 안수가 불가한 교단들과 여성 안수제를 도입한 지 오래된 교단에도 여전한 여성 리더십의 낮은 비율, 열악한 처우 및 성폭력 피해, 여성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 및 전망을 살핀다.
손쉽게 책 한 권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 여성 안수를 둘러싼 투쟁사를 개괄할 수 있다. “총회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뷰이를 구하지 못해 고생한 기자들의 후일담과, 백소영 교수가 쓴 서문에 눈길이 머물렀다.
“이 싸움이 ‘여성’을 넘어 ‘여성적’인, 그리고 ‘여성주의적’인 리더십에 대한 고찰로 더 나아가야 함을 보게 된 것은 ‘평신도 여성 신학자’의 눈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 여기서 ‘여성적’이란 돌봄 목회, 은사 집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쪼기 서열’의 가부장제 문화가 가득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부여하신 다양한 재능과 시선, 능력들이 제도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적’이란 ‘아직 제도 안에서 실현되지 않은 인간성의 반’이다, 우리의 할 일은 이것을 제도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김다혜 기자 daaekim@gosc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