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호 에디터가 고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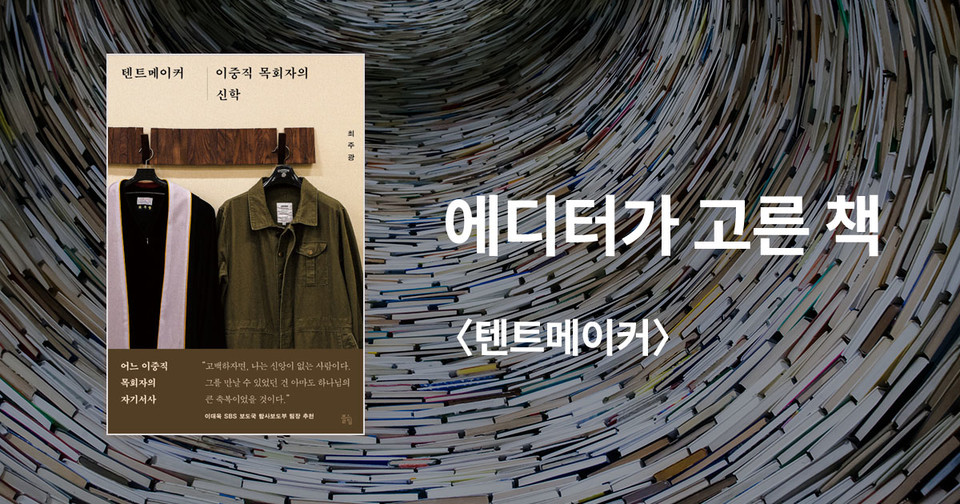
소위 생활에 찌들고, 거칠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곁에 없다. 대안적 담론들에 둘러싸인 환경에 감사하면서도, 머리로 동의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라, 나를 ‘깨뜨려줄’ 목소리를 찾고 싶었다. 기울어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나의 (배부른) 고민에, 누군가는 “목회자가 하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신도들 삶과 유리된 설교를 하던 목사들이 떠올랐고, 이 책을 집어들 수밖에 없었다. 과거 소년수였던, 이제 일하는 목회자 9년 차인 저자가 부딪히고 있는 삶의 현장과 시각이 궁금해서.
세월호 이후 제도권 교회를 떠난 저자는 일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목사로의 부르심뿐 아니라 부모로의 부르심과 생존 문제 또한 포기할 수 없기에. 그가 선택한 일은 목수. 단기 고용 노동자로 일하며 가장 힘든 것은 일의 강도가 아닌, 언제 또 일이 생길지, 다음엔 어느 곳으로 출근할지 모른다는 ‘불안정함’이었다. 곤돌라에 의지해 바람을 맞으며 고층 건물에서 몰딩을 돌리는 아찔한 노동을 경험했고, ‘노동자의 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현장 선배들에게 일당을 떼어주어야만 했던 저자가 읽는 말씀은 무엇이 다른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는 주인을 원망한다. 논점은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 그런데 일이 끝날 17시가 되어도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일이 없을 것이라며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던 이의 삶은 어땠을까.”
“어이, 거기, 야”로 불리기도 하고, ‘데나우시’ ‘야스리’ 같은 낯선 현장 용어 등을 익히며 저자는 제대로 호명되는 일과 언어 선점이 갖는 권력을 고민해보기도 한다.
“혼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법정이나, 혼자서는 알아서 일을 할 수 없는 노가다 현장이나 결국 언어를 선점한 이들이 힘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말을 듣지 않음이 힘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은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지혜’라고 말한다. … 말의 힘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언어를 강요하기를 멈추고 상대의 언어를 듣는 것이 아닐까.”
내겐 여전히 새롭지 않은(?) 해석인데, 굳은살 박인 손과 땀이 느껴지는 글은 머리가 아닌 마음을 건드린다.
김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