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호 동교동 삼거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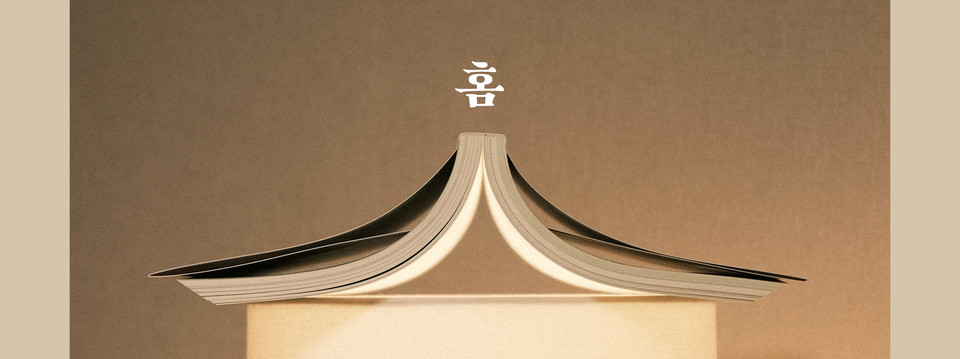
집을 그리라 하면 일단 푸른 초원 위에 네모를 만들고, 지붕을 얹고, 그 안에 가족들을 넣었습니다. 창문도 있고, 그 앞에 산도 있어서 조망권은 기본이고, 강도 있어서 물 부족할 염려도 없고, 해님도 밝게 빛나서 채광도 보장된 공간. 이 그림의 덧없음을 인지한 건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집은 바깥에서 보는 풍경이 아닌 일과를 마친 후 마주하는 조명, 침대 등 좁은 방을 채우는 가구들이었죠. 이제 집을 그리라 하면 무엇부터 그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호는 희년실천주일을 맞아, 희년실천을 이어온 ‘희년함께’와 공동 기획한 집 이야기입니다. 그 일환으로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인터뷰를 정리했는데요. 16년 전(2009년)의 용산 참사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공공의 권한을 받은 자들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며 헌 건물을 허물고 개발을 하는 동안, 집에 대한 사람들의 꿈이 강제 철거당하기도 했죠. 한국 도시 개발의 역사를 보면, 2023년 이후 인정받은 3만 400건의 전세사기는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2030에게 주거 영역은 꿈을 꺾는 위험 지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사회 주거권의 현주소를 그려봅니다. 힘을 모아 실천할 일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석 한 주 전 9월 28일에 열리는 희년실천주일 연합예배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별책 부록 책갈피 참고). 주거권 이야기는 다음 호(10월호)에서 더 다양한 사례로 이어집니다. 이번 공동 기획이 우리 세상을 가꾸고, 우리가 살 집을 그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