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호 교회력, 계절의 독서] 주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를 포개는 두 권의 책
‘세상을 망치는 중’인 〈쇼미더머니〉가 막을 내렸다. 래퍼들의 삶이 담긴 노래가 주는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 없이 훅(Hook, 반복되는 후렴구)을 흥얼거리고 있는 나를 보면, 나에게 〈쇼미더머니〉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훅은 여러 기능을 한다. 쉴 새 없이 가사를 뱉던 래퍼가 잠시 쉬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잘 만들어진 훅은 노래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체 가사 방향을 이끈다. 청중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 짧은 몇 문장으로 노래를 뇌리에 남긴다. 이처럼 훅은 힙합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예수님의 삶에도 훅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들었던 음성일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마 3:17, 새번역) 그분의 삶에서 반복되고, 그분의 삶의 방향을 이끌고,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예수님의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음성이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삶을 건너뛰고 탄생·죽음·부활에 마음을 모으곤 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사도신경이 한 예다. 교회력 역시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회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에 머무는 기간이 존재한다. 성탄과 부활 사이에는 1월 6일 ‘주현절’(공현절)이 있다. 사실 주현절은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자리 잡기 전에 성탄절 기능을 했던 ‘성탄절 이전의 성탄절’이다. 그러나 서방 교회는 여러 이유로 주현절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주현일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수세 주일’을 마련하여 그 맥을 이어간다. 이날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 현현과 함께 공적 삶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하며 경축하는 날이다. 이처럼 교회력은 우리에게 예수께도 삶이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새삼 가르쳐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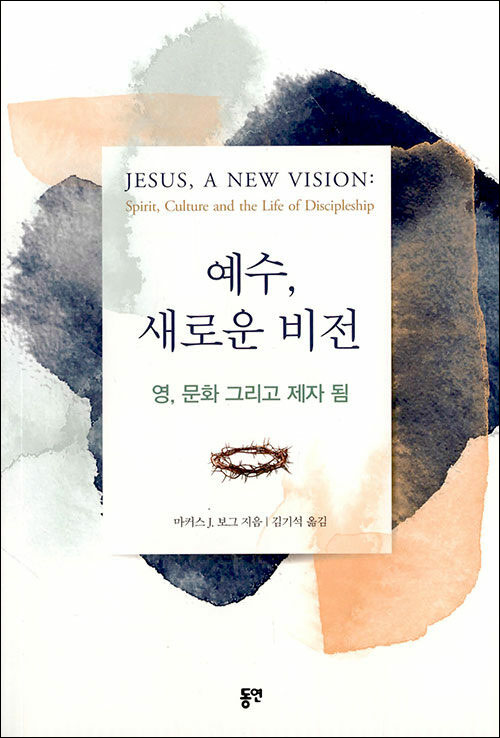
예수 사역의 시작
역사적 예수 연구자로 잘 알려진 성공회 신학자 마커스 보그는 《예수, 새로운 비전》(동연)에서 예수님의 공적 삶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하늘의 영이 임했던 세례 경험에 주목한다. 이 경험은 그분의 비전과 사역의 원천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막 1:11) 이 세례나 비전 그 자체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이유가 거의 없”으며, “예수의 사역은 영의 체험으로 시작되었으며 다른 세계와의 접촉이 내내 그를 밀어붙였다.”(66쪽)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 사역을 추동하는 힘이었다. 그분 삶 곳곳에 그 음성의 흔적이 노골적으로 남아있다. 세례 직후 그분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는 장면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마 4:3;6)이 반복된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눅 11:2). 고난이 예고된 예루살렘 입성 전 변화산에서도 ‘내 아들’이라는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들었다(눅 9:35).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다(눅 22:42). 그분의 귀에는 사랑의 음성이 언제나 맴돌았다. 그분의 입과 행동에도 그 사랑이 배어있었다.
그 사랑의 음성은 로마 시대에 지배적이었던 폭력과 권위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 질서의 세상과 접속하는 경험이었다. 그 음성에 이끌려 살았던 예수께서는 세상의 인습적 가치와 충돌되는 다른 세계의 사람, 영의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접속한 자비와 친밀함이 충만한 영의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됨의 근본적인 특질은 자비였다.”(204쪽)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 ‘자비’는 단순한 종교적 진술 이상이다. “이것(자비의 정치학과 에토스)은 이스라엘 사회가 인습적인 지혜, 거룩, 배타주의, 가부장제를 뒤섞어서 만들어 낸 장벽들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는 자비를 근간으로 삼아 포괄성과 수용과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규범들로 구성된 대안적 공동체를 창조함으로써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적 세계를 변화시키려 했다.”(206쪽)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세례 시에 들었던 ‘하늘의 음성’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내는 음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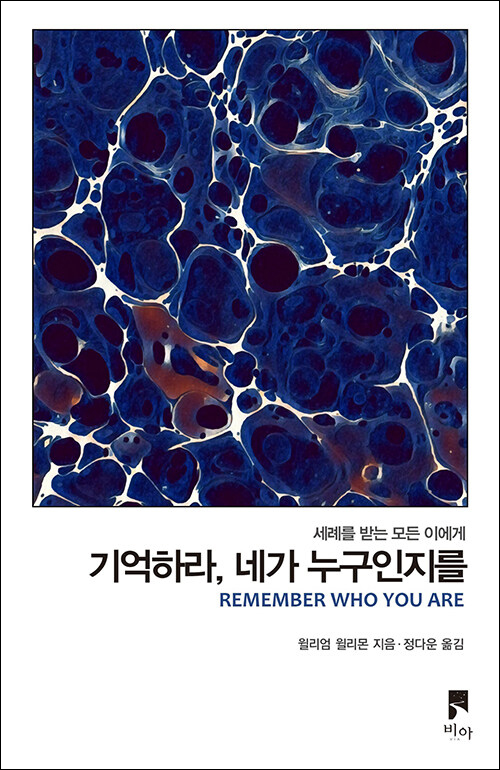
그리스도인의 시작
세례는 그렇게나 엄청난 일이다. 예수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의 중요성을 자주 잊는다. 그런 우리에게 수세 주일은 그분의 세례에 우리의 세례를 포개어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주님의 세례에 주목하며, 우리 존재를 질문하는 여정에 좋은 도반이 있다. 목회자의 목회자 윌리엄 윌리몬이 쓴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비아)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배우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례를 통해 처음으로, 또 최종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의례입니다. … “거룩하신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그분께 절실히 물을 때 세례는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로, 머리와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진득한 기름으로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37쪽)
우리는 세례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에서 주는 세례명만이 아니라, 교단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 세례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어느 단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나를 포함해 내가 만난 대다수 사람은 자신의 세례에 만족하지 못했다. 특별한 체험을 기대했는데 실망하기도 하고, 기대와 각오 없이 받았던 무미건조한 세례를 후회하기도 한다. 그렇게 한 번쯤은 ‘재세례’를 고려하곤 한다. 그러나 세례가 우리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과거의 세례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윌리엄 윌리몬 말마따나 “세례는 특정 순간, 예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 것이며 일생을 통해 완성되는 것”(165쪽)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일은 멋없던 세례식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후회해야 할 것은 참된 신앙고백 없이 어물쩍 받아버린 세례가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삶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세례가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의 본래 형상을 되찾는 일이 아닐까. 우리의 세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현절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세례를 통해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러나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세상은 저 멀리에 있지 않다. 우리 옆에 나와 함께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다. 세례는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묶어준다. 세례는 성, 인종, 나이, 계급, 국적, 장애, 정치, 사상의 위계를 풀어버린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랑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늘엔 입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말이다. 서로가 하늘의 입이 되어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 그동안 교회에서 생각없이 숱하게 뱉었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진심 어린 사랑의 ‘훅’으로 들려주면 어떨까?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가 지칠 때 쉼이 되어주며,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며,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그렇게 망쳐버린 세상을 고치는 노래가 되길.
이광희
그렇게나 교회를 좋아하더니 교회의 일꾼이 되어 ‘덕업일치’를 이루었다. 한신대 학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팟캐스트 〈모두의 아멘〉과 유튜브 〈예배에 관한 아무 말〉 등 이것저것을 시도하고 있다. 가끔 글도 쓴다. 옮긴 책으로 《내일의 예배》(브랜든선교연구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