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호 동교동 삼거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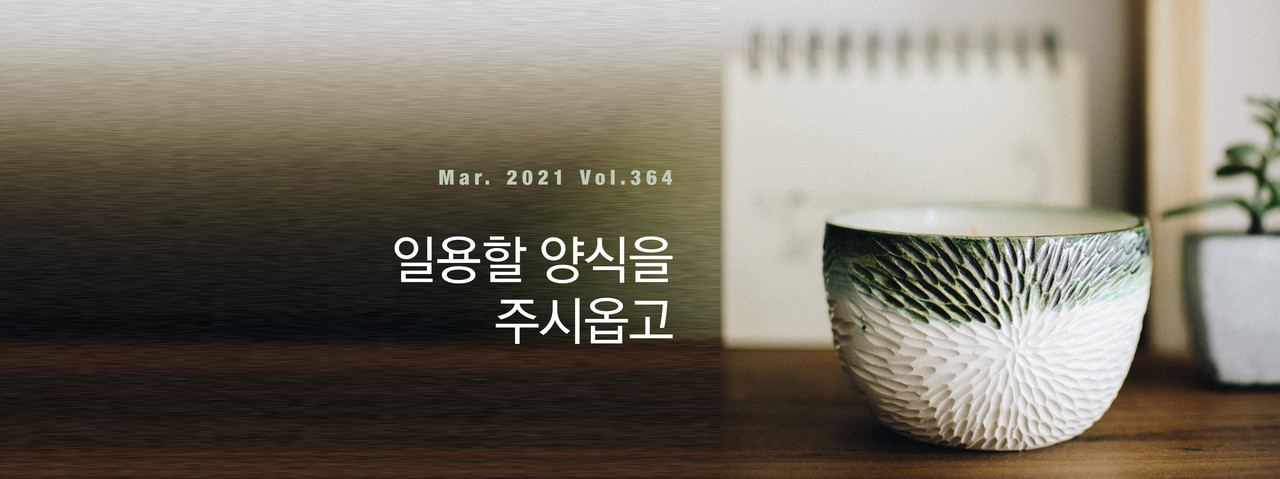
끼니때마다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식당을 가자니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이고, 배달을 시키자니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직접 요리하거나, 포장해오기엔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메뉴 선정에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끼니때를 훌쩍 넘겨서야 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끼니를 ‘때우는’ 많은 이들의 고민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으니까요.
이참에 끼니 고민에 더해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언급한 ‘일용할 양식’에 관해 곰곰이 따져보면 어떨까요? 이번 커버스토리는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 신앙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필자들은 신앙의 눈으로 먹는 문제를 숙고하며, 팬데믹 시대를 건너는 지혜를 전합니다.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연이 있었음을 아로새기고(김종철), 우리가 마주한 밥상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짓밟힌 흔적을 발견합니다(장양미). 일용할 양식이 아닌 일용할 ‘상품’을 먹는 한, 주께서 주시는 만나를 결코 맛볼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씨앗 뿌리고 밭 일구어 직접 기른 끼닛거리로 밥상을 차리는 모습(천다연)을 우리의 식생활과 대조하여 보아도 좋겠습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를 바라보는 LG전자 정규직 사원의 번뇌 가득한 글을 읽으면서는 ‘우리’는 누구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 6:11)에서 ‘우리’는 누구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범위를 넓혀 갈수록 마음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생선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기 위해 이주어선원들의 강제노동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도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쉽게 읊지 못하게 합니다(사람과 상황). ‘우리’의 범위를 넓힐수록 나의 일용할 양식은 초라해질 것이기에 그 나라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순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최대한 많이, 가능한 한 빨리 먹어버리는 것이 돈이 되는 먹방 시대에 복상은 일용할 양식의 가성비를 계산합니다. 음식에 깃든 수많은 사연과 의미를 먹는 이가 얼마나 오롯이 받아내고 삶으로 소화하는지 효율을 따져보자고 제안합니다. (지면에는 미처 싣지 못했지만, 사순절을 맞아 진행되는 ‘40일 탄소 금식’(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사순절 채식 순례’(청어람ARMC) 등도 추천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뭇 생명의 희생이 필수적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새삼 마주합니다.
복상 실무진의 큰 변화를 알립니다. 전임 편집장이 떠나고 5년여 경력의 강동석 기자가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평균연령 32세의 ‘젊은’ 복상이 되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복상이 이제부터는 ‘젊은 목소리로 미래를 말하라’는 사인일 텐데요. 이런 현실이 낯설어 자꾸 과월호만 들추어 봅니다. 젊은 기자들에게 의지하며 한 발씩 내딛겠습니다.
이범진 편집장 poemgene@gosc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