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호 잠깐 독서]
독자적 그리스도교 문명을 만든 중세 유럽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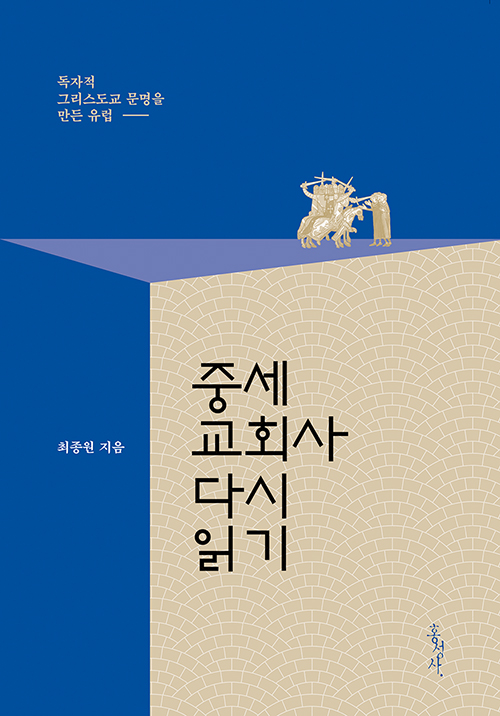
중세교회사 다시 읽기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를 쓴 최종원 교수의 ‘교회사 다시 읽기’ 제2탄. ‘암흑기’로 인식되어 온 중세를 재평가하는 역사계 흐름에 발맞춰, 독자적 문화를 형성하여 르네상스와 근대를 이끈 중세교회를 재평가하는 책이다. 교황제뿐 아니라 수도회, 중세 형성을 추동한 비잔틴과 이슬람 문명 등의 기여도 다루고 있다.
종교는 사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것이라는 당연하지만 새삼스러운 인식이 고도로 교권화된 성직 체계를 흔들었다. 더 나아가 이단 운동들은 교황이 보유한 세속의 권세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두 운동〔이단 운동, 탁발 수도회 운동〕은 과도한 성직자 중심주의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세력화된 교회를 비판하고, 사도적 삶(vita apostolica)과 사도적 청빈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276쪽)
보냄받은 이의 관점에서 읽는 고린도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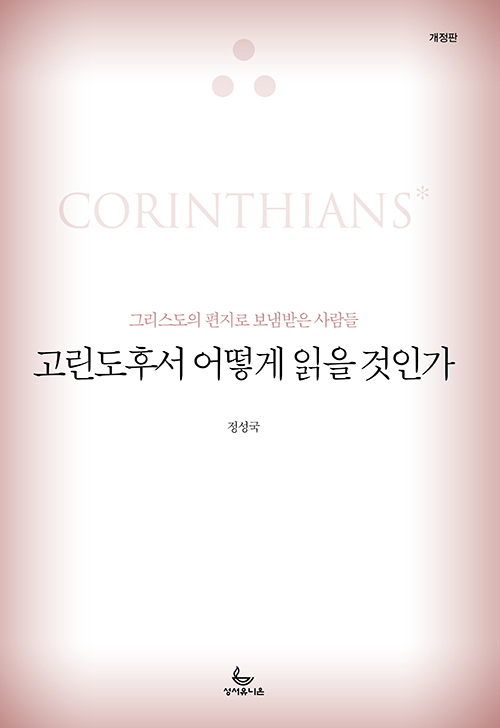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새로운 저자가 쓴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판.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증인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집필했다. 성경 구절과 단어를 분석하는 이 책은 오늘날 독자에게 고린도후서의 선교적 읽기를 제안하면서 보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증인공동체의 형성이 바울의 사역 목표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방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1:1, 19), 그리고 디도(2:12-13; 7:5-16; 8-9장)와 사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과 동역했다. 고린도후서를 계속 읽다 보면, ‘과연 디도가 없었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된다. 바울의 편지는 바울 스스로가 작은 증인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동역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이와 연관해서, 편지의 서론(1:1-11) 단락의 주어가 모두 ‘우리’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41쪽)
한·미를 중심으로 본 복음주의의 역사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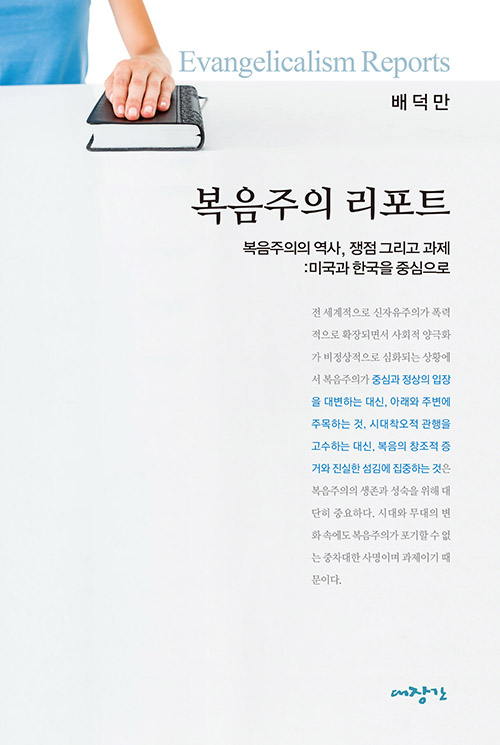
복음주의 리포트
한·미 복음주의의 역사와 논쟁거리, 그리고 과제를 다룬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복음주의의 역사와 사회개혁 간의 관계 및 오순절 운동을, 2부는 빌리 그레이엄이나 짐 월리스 같은 복음주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복음주의 갈래를 소개한다. 3부는 근본주의와 진보적 복음주의, 신사도개혁운동과 교회 세습, 혐오와 차별 문제 등을 다룬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인권·시민단체에 의해 추진되었을 때, 개신교 진영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와 갈등이 발생했다. 2013년에는 두 건의 차별금지법안이 보수 개신교의 압력과 반발로 자진 철회되었으며, 2014년에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공포되지 못했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각종 조례들이 ‘성소수자’나 ‘성적 지향’의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기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보수 개신교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에게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454쪽)
일방통행이 아닌, 대화하는 기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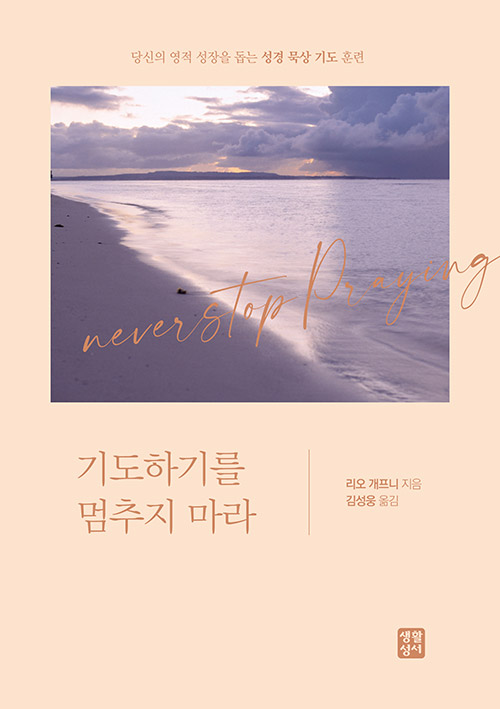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성경 묵상 기도’ 안내서. 저자는 올바른 기도란 바라는 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바를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부담 되지 않게 주간 단위로 구성된 이 책은 매주 평화, 말, 물, 용서 등 한 가지 주제를 제시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북돋는 단계별 기도를 제안하여 찬찬히 따라갈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와 함께해 오시면서 지극한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인류 전체 차원에서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서서히 진보해 나갈 줄을 내내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약하게나마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서도, 그 과정에서 잊어버리거나 과오를 범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배움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계시해주시는 방식이자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서야 할 방식입니다. (66-6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