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호 올곧게 읽는 성경] 초대교회의 급진적 포용주의와 성소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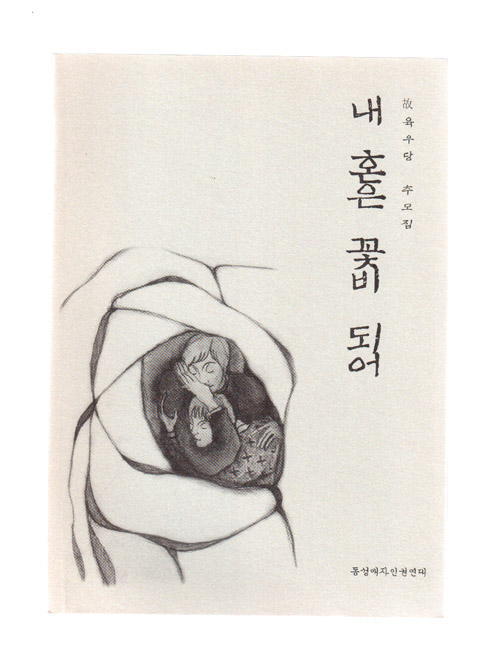
1.
나는 사실 성소수자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나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그것이 한 인간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서울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퀴어 축제 때마다 벌이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또 한번 좌절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에게 몹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성서를 공부하고 신학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무관심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내가 젊은 신학도로 한창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은 군사독재 시절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은 시대의 심장을 관통했다. 정치적 억압과 물리적 폭력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해졌던 그 시절, 특별히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명백한 불의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도덕적 분노를 정치적 저항 의식으로 키워갈 수 있었다. 누구는 잡혀 들어가고 누구는 고문으로 정신 줄을 놓았다는 이야기는 그저 풍문이 아니라 한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이 실제로 겪는 일이었다. 우리 세대는 전태일에게서 이타적 삶의 고결함을 배웠고, 그것은 광주에 대한 도덕적 부채 의식으로 이어졌다.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은 이러한 도덕 감정을 신학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군부 정권과 민주 진영이라는 양대 진영으로 사회가 나뉜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정의감을 배워가다 보니 도처에 복잡하게 그물망처럼 얽힌 다양한 문제들을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는 둔했다. 심지어 20대 때 나는 동성애 문제나 생태 문제는 제1세계 여유로운 사람들의 한가한 문제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간단히 말해 나는 성소수자 문제를 민주주의와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이 신앙과 신학의 문제임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성소수자 인권이 사회문제가 된 후에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전에 별다른 마음의 흔들림 없이 대했던 일들, 가령 이화여대 성소수자 동아리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의 (대)자보를 기독교인 학생들이 훼손해서 이에 항의하는 자보를 학생관에서 읽으면서 기막혀 했던 기억, 내가 가르치던 교양과목을 수강하던 학생이 자신의 성적 지향 문제로 내게 찾아와 어렵게 말문을 열던 기억 등이 떠올랐다. 동성애자 차별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했겠지만, 당시에는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할 줄 몰랐고, 그들에 대한 일상화된 차별에 분노하지도 않았다. 가슴으로가 아니라 머리로만 그들을 대했던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제 인간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고 사물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서 한 인간의 삶에서 성적 층위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성적인 문제가 단순히 분리된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 전체와 결부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성소수자 문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즉 민주주의의 근본과 연결된 정의의 문제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신학이, 성서가 한 인간이 그 자신인 것을 부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할 의무가 신학자인 내게 있다고 느꼈다.

